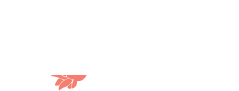함진아비가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함 사세요”라고 외치며 함을 들고 오는 날은 결혼 전 이벤트로 동네 잔치였다. 최근에는 이웃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함을 받는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함 자체는 백년가약을 맺는 두 사람의 증표인 혼서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함이란 무엇인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보내는 일종의 선물이 ‘함’이다. 혼인에 대한 언약을 담아 평생 지니고 있어야 할 만큼의 의미를 지닌 혼서지, 음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청홍 비단 외에도 신부를 위한 예물 등을 넣은 ‘보물 상자’다.
함 속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신랑의 생년월일과 시를 간지로 표시한 ‘사주단자’, 혼인을 정식으로 청하는 문서인 ‘혼서지’, 노란 콩(노란 주머니)・팥(붉은 주머니)・숯(연두 주머니)・찹쌀(파란 주머니)・목화씨(분홍 주머니)를 각각 다섯 가지 주머니에 넣은 ‘오방주머니’, 청홍 옷감인 ‘채단’이 기본이다. 빛나는 거울처럼 앞날을 비추라는 의미로 ‘거울’을 넣기도 한다. 요즘에는 여성 정장 한 벌, 화장품 세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반지와 예물 세트 등이 더해진다.
함 속에 넣는 물건의 의미는?
사주단자란 신랑이 출생한 연월일시, 즉 사주를 적은 것으로 두 사람의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생긴 풍습이다. 이미 결혼하기로 한 후에 이뤄지는 과정이므로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오방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곡식은 예로부터 복스럽게 여겨진 다섯 가지 색깔에 기인한 것이다. 며느리의 심성이 부드럽기를 기원하는 노란 콩, 액을 물리치려는 팥, 두 사람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숯, 백년해로하라는 찹쌀, 자손이 번창하라는 목화씨이다. 혼서지는 ‘귀한 딸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든 편지로 최근에는 한복집에서 마련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위기다.
함을 싸는 순서는?
칠기 함이나 오동나무 상자를 준비한다>함의 맨 밑바닥에 한지를 깐다 >네 귀퉁이와 중앙에 준비한 오낭을 차례대로 넣되 노란 콩을 담은 주머니를 가장 중앙에 놓는다>예물 중 하나인 거울을 넣고 청홍 보자기에 기러기나 원앙 한 쌍을 싸서 놓는다>청색 비단은 붉은색 한지에 싸서 청색 명주실로 매고, 홍색 비단은 푸른색 한지에 싸서 붉은색 명주실로 맨 후 청 채단 위에 홍 채단을 놓는다>중간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혼서지를 놓는다. 요즘에는 일련의 것들을 한복집에서 모두 준비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함 보내기와 받기, 어떻게?
함을 보내는 시기는 넉넉하게는 결혼식을 올리기 한 달 전부터 빠듯하게는 일주일 전까지다.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고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 보통 주말 저녁에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진아비가 함을 팔러 들어오는 모습을 구경하고 함을 팔고 난 후 함께 즐기는 게 동네 잔치였지만 요즘에는 그 풍경이 많이 사라졌다. 떠들썩한 함 받는 풍경 대신 신랑 혼자서 함을 가져가고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모이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Part 2. 신부가 드리는 첫인사, 예단
Part 2. 신부가 드리는 첫인사, 예단예비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비단을 뜻했던 예단. 비단이 귀했던 시절 그것을 선물로 전하며 예를 표현했던 것. 시대가 변해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품목들은 변했지만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드리며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은 여전하다.
예단 기준,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혼이란 두 집안이 만나는 것으로 서로 형편이 조금씩 다르고, 가풍이나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기에 양가 집안이 예단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당사자인 신부와 시부모님(보통 시어머니) 간의 충분한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도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예의를 갖춰 최소한의 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 시어머니께 직접 묻기가 부담스럽다면 신랑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의중을 묻거나 신랑의 형제자매 중에서 기혼자인 사람에게 결혼 당시의 예단 규모나 형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단을 받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
예단을 받는 이들의 범위는 결혼식 때 폐백을 받는 친척의 범위와 일치시키면 된다. 과거에는 신랑 직계 사촌에서 팔촌까지 두루 포함시켰지만 요즘에는 가족 단위가 축소되고 과도한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 보통 사촌까지 챙기는 데 좀 더 간소화한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만 범위에 넣기도 한다. 요즘에는 촌수에 구분하지 않고 가깝게 지내는 이들 위주로 챙기기도 한다. 이 부분 역시 시어머니와 충분히 상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단에 들어갈 품목은?
시부모님께 드리는 예단은 이불 세트(요, 이불 한 벌, 방석 두 개, 베개 두 개), 의류 한 벌(한복과 양복 중 취향에 따라), 반상기 세트, 은수저 세트가 기본이다. 여기에 병풍, 보료, 모피나 명품 브랜드 가방, 보석 같은 장신구가 더해지기도 한다. 자세한 내역은 집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에 천차만별이다. 다만 신부 형편에 맞추되 정성을 다했다는 표시를 하면 된다. 가족, 친지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떡을 추가로 마련한다든지 꽃이나 진심이 담긴 손 편지를 전하면 좀 더 정성이 깃들어 보일 것이다. 현명한 신부라면 결혼 후 필요한 혼수는 살면서 차차 마련한다 생각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줄이되 어른들 것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예단은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첫인사이니 만큼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금 예단의 수준은?
시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현물을 직접 사서 드리는 것이 예의고 나머지 직계가족에게는 상황에 따라 현금을 보내기도 한다. 예단비 수준에 한계는 없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잡는다면 전체 결혼 예산에 맞춰 적당한 비중을 예단 비용으로 빼놓으면 된다. 이 중에서 현금 예단은 시댁 가족들 수에 맞춰 보통 남자의 경우 양복 한 벌 값, 여자의 경우 한복 한 벌 값 정도를 현금으로 전한다. 예단을 보낸 후에는 신랑 측에서 예단비의 1/3에서 많게는 1/2 정도를 ‘봉채비’(혹은 ‘봉채’)라는 명목으로 신부 측으로 보내는데, 집안이나 지역 풍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단을 보내는 시기는?
예단은 결혼식 한 달 전에 보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단 준비는 그전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예단 안에 들어가는 이불은 맞추고 받는데 15일 이상 걸리므로 두 달 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스튜디오 촬영 때 한복이 필요하므로 한복 역시 결혼식 두 달 전에는 맞춰야 한다.
박희수 씨는…
한복 칼럼니스트 겸 전통문화 전시기획자로 현재 ‘YU&PARK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 활약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기획을 두루 맡고 있다. 함과 예단은 물론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결혼 준비와 전통 예절>(동아일보사)에 녹여내기도 했다.